https://www.youtube.com/watch?v=wpU9VP-yP3w&t=15s
인간도 오래전에는 식인을 했다? 우리가 몰랐던 충격의 고고학 증거들
현대의 관점에서 식인 행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기입니다. 하지만 정종우 이화여대 교수의 강의에 따르면,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실제로 식인 행위를 해온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몰라게르시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뼈, 북미 아나사지 유적지 등에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뼈에서 살점을 발라낸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 조상들이 식인을 했다는 과학적 증거로 해석됩니다.
식인의 이유는 단순히 '악'이 아니었다: 생존, 의식, 위협 회피
그렇다면 왜 인간은 같은 종을 먹는 식인 행위를 했을까요? 단순히 '잔혹함'이나 '비정상'이 아니라, 생존 전략, 종교 의식, 위협 회피라는 실용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 극한 생존 상황: 1920년대 러시아 대기근, 우크라이나 대기근, 그리고 1972년 안데스산맥 추락 사고 생존자들의 실화는 식인이 생존의 선택지였음을 보여줍니다.
- 종교·장례 의식: 포레족처럼 죽은 자의 일부를 가족이 먹는 장례 의식도 있었습니다.
- 포식자 회피: 죽은 자의 시신을 매장하기 전, 포식자 유입을 막기 위해 살점을 제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물도 자기 종을 먹는다? 동종 포식은 자연계의 보편적 현상
놀랍게도 동종 포식(cannibalism)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태계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물고기,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이 동종을 잡아먹습니다.
이는 생존 전략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먹이를 쉽게 확보하고, 경쟁자를 줄이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종 포식의 치명적 단점: 왜 진화의 주류가 되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왜 동종 포식이 널리 퍼지지 못했을까요? 정종우 교수는 3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 질병 감염 위험: 같은 종은 같은 기생충, 병원균에 쉽게 감염됩니다. 예시로 포레족이 식인 행위를 통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유사 질병인 구루병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개체 수 감소: 개체 수가 줄어들면 종 전체의 생존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 공격 위험성: 건강한 개체를 잡아먹으려면 자신도 상해를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오히려 에너지 대비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식인은 생존 전략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왜 '식인 금기'라는 도덕을 진화시켰을까
결국 인간은 지능이 발달하면서 식인 행위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되었고, 문화와 도덕, 종교 등을 통해 이를 금기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다른 먹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종을 먹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발전시킨 배경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병의 위험, 사회적 충돌, 공동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식인은 인간 사회의 금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식인은 생존 전략이었으나, 인류는 '도덕'을 선택했다
식인 행위는 과거 인류에게 실질적인 생존 수단이었지만, 진화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기로 자리 잡은 것은 단순한 감정적 혐오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이 단순한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전략이자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식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야만이 아니라, 인간 생존과 도덕의 경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일지도 모릅니다.
해시태그
식인행위,동종포식,진화생물학,구루병,인류진화,식인금기,동물행동,포레족,식인의역사,생존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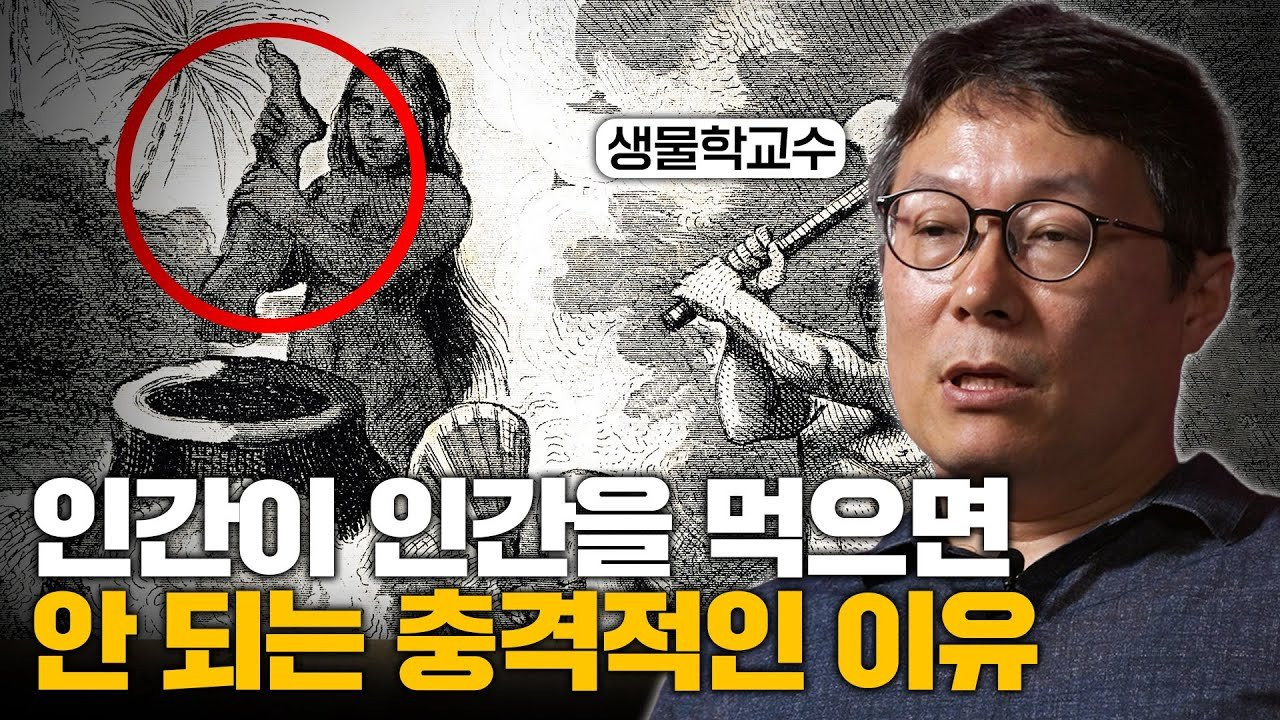
'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뇌를 지치게 하지 않고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법: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기반 공부 전략 (0) | 2025.03.30 |
|---|---|
| 인간에게 섹스란 무엇인가? 진화로 본 성의 본질과 충격적 전략들 (0) | 2025.03.25 |
| 자극에 반응하는 '동물'로 보는가? 미국 심리학의 충격적인 본질 (0) | 2025.03.15 |
| 트럼프가 부정한 성별, 자연은 답을 알고 있다 - 제3의 성은 존재할까? (0) | 2025.03.07 |
| 펭귄이 하늘을 날지 않게 된 이유: 비행을 포기하고 바다를 선택한 비밀 - 이정모 관장 강의 요약 (0) | 2025.03.03 |




댓글